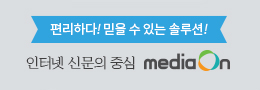|
침묵(沈黙)
내가 안성군수로 재직시절이니까, 지금부터 20여년 전 일이다. 당시 죽산면 칠장리에 천년 사찰이며, 인목대비의 書札(서찰)이 보관되어 있는 ‘七長寺(칠장사)’를 찾은 일이 있었다. 나는 경내를 돌아보고 나오다 한곳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요사채 앞에 놓은 작은 푯말 때문이었다. ‘黙言 遂行中(묵언 수행중)’ 쾌 어설픈 글씨로 푯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묵언이라니..., 그렇다 일체의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고 道(도)를 깨닫는다는 그런 뜻을 수행도 있다는 것을 안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막 사찰 경내를 벗어나 산길을 내려오는 내 귀에는 천길 고즈넉함도,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인 듯 들여오고 있었다. 굳이 묵언수행이 아니더라도 평소 나는 꽤나 말수가 적은 편이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열중할 뿐,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쉽게 내놓지 않는 것이다. 따지자면, 구태여 그런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얼마 전 어느 모임 자리에선가? 나는 예의 그 과묵 탓에 한 선배로부터 질책 아닌 질책을 받았다. “이봐 자네는 뭐 농아학교 출신이야? 한마디도 안하고...,” 술김에 허튼 농담이었어도 꽤 아프게 들렸다. 평소 내 나름의 은밀하게 감췄던 약점이 그렇게 들통이 나고, 찔렸던 탓이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공짜로 듣기 좋아했던, 내 염치없음에 대한 혹심한 댓가인지도 모를 일이다. 말이란,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신, 언, 서, 판(身, 言, 書, 判)이라고 중국 당나라에 서는 관리를 점령하여 뽑을 때, 말 주변을 그 한 가지 주요한 기준으로 삼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막상 달변으로 말 잘하는 이들을 보면 그 말솜씨야 말로 훈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의 하나라고 생각한 적도 적지 않았었다. 나 또한 그런 생각 탓에 더러는 화법에 관한 책들도 읽고, 더러니 값싼 유머집들을 사서 읽기도 했었다. 특히 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트나 유머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전달하려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청중들을 즐겁게 웃기기 위한 유머가 더 값지지 않은가? “군수님 말씀 없으신 것도 좋다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남에게 일종의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그러시면 아이들이 역시 아버지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고요!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자기표현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얼마나 삭막한 가정이 되겠어요!”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동창인 모 주부로부터 이런 따끔한 충고를 받았다. 나를 드러내 놓고 표현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달변은 그래서 큰 공덕인가 보다. 아마도 묵언수행 아닌, 과묵은 내 마음이 절속에서나 닦아야 할 수행인 모양이다. 요즘 세상에서 침묵은 대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듯하다. 소극성의 다른 이름이거나, 무관심의 표시, 심지어 비겁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침묵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외적 공간은 클래식 공연장에서 침묵은 대전제다. “화가들이 빈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 듯 우리는 침묵이라는 빈 공간에 音(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초, 중반 활약한 지휘 거장 ‘레오폴드 스토콥스(1882~1977)’가 소란스러운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정중하게 건넨 이 말은 여전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침묵은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위다. 짧게는 10분 안팎에서 길게는 한 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 침묵을 지킨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이던가! 흔히 공연장에서 관객은 수동적 존재로 인식된다. 하지만, 최대한 침묵을 지킴으로서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침묵의 기능이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7년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 루페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끌던 이탈리아의 거장 ‘틀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가 밀러 교향곡 3번을 지휘한 공연이었다.’ 이 작품은 교향곡으로 세상 만물을 ‘포용’하려 했던 ‘밀러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대작이다. 무려 여섯 개 악장에 걸쳐 무생물, 식물, 동물, 인간, 천사, 신의 단계가 차례로 그려진다. 연주시간은 90분이 넘는다. 유장하고 경건한 피날레 악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거의 모든 악기가 참여해 장엄한 음률을 빚어내면서 ‘신의 경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그 마지막 울림이 찾아드는 순간 아바도의 지휘봉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1분 넘게..., 때로 침묵은 공연에 대한 깊은 공감의 표현, 수단이 된다. 그런 경우 침묵은 연주자들을 향한 최고의 찬사이며, 나아가 공연을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경지에 올려놓는다. |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