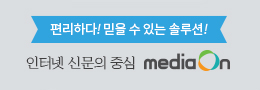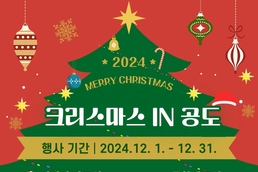최근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활발하다. 원래 복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화두 중 하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 이상적인 복지국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의 모델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빈부 간,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자립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진정한 복지는 단기적이 아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바탕 위에 지속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개념의 복지에서 벗어난 ‘묻지마’식 포퓰리즘 복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무상의료에 반값 대학 등록금까지 이른 바 ‘3무+반값’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기치로 성과를 본 일부 정치권에서 이러한 무상시리즈를 내세우고 있다.
무상급식이 혜택을 받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기에 여타 사업에 쓸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취약 계층 지원과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에 쓰일 예산을 줄여 넉넉한 집 자녀의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무상의료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갖춰진 나라가 거의 없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거지 두 명 중 한 명은 병원비로 거지가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실업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긴 대기 시간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이 적지 않다. 이에 비해 우리 국민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게다가 8조만 있으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30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원 마련방안도 명확하지 못하다.
대한민국이 과연 이러한 무상시리즈를 감당할 수 있을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에서 4만 달러 수준의 복지를 바란다면 남는 것은 빚 밖에 없다. 일본은 나라 빚이 지난 해 900조 엔을 넘어섰고,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일본의 위기가 전적으로 과도한 복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논란은 있으나 만성적 재정 적자와 채무에는 아무리 잘사는 국가라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 부채도 2012년 486조에 이른다니 마음 놓을 상황이 아니다.
만일 빚을 얻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을 늘려야 한다.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과 핀란드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40~50%에 달하며, 국민은 소득의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납부한다. 공짜라서 좋은 줄 알았던 무상시리즈가 실은 나라 빚과 무거운 세금인 것이다.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작금의 무상시리즈는 지금 세대에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고,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넘기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내년이면 총선과 대선 등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복지 싫어하는 유권자가 없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치권의 무상시리즈는 더욱 도를 더할 것이다. 최근 선거 공약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세종시 수도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 등에서 선거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표도 좋지만 정치권은 공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실에 기초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나라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공약은 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무상에 현혹되면 나라 곳간은 텅 비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바람직한 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